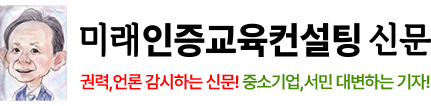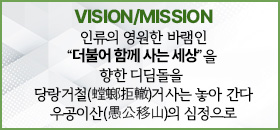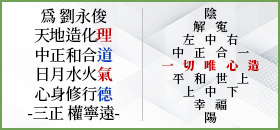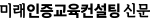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